
 아산아카이브즈
아산아카이브즈
 도서자료실
도서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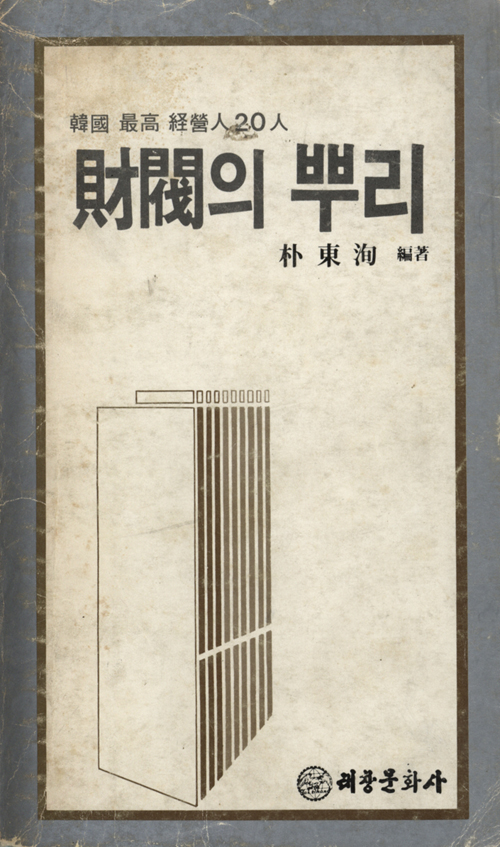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1979년까지만 해도 기업인에 대한 자료조사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기업사를 연구하기에 어려움이 매우 많았다. 이에 『재벌의 뿌리』에서 편저자는 한국의 기업인 20인을 선정하여 그 기원과 활동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냈다. 정주영에 관한 내용은 「成長의 열매를 萬人에게」 라는 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온다.
정주영은 강원도 통천출신으로 현대라는 상호를 ‘세계의 기억’으로 부각시킨 한국의 실업인 으로 소개된다. 그는 소박함, 근면함, 성실함 등의 무기와 다양한 현장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중공업 체제 형성에 있어서 발휘된 그의 저력은 현대그룹을 1970년대 한국 기업 그룹의 선두 주자로 만들었다.
1970년대의 한국의 중공업은 현대 그룹과 거의 동의어처럼 해석되었다.
정주영은 농가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송전 소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원산에 가면 일자리가 많고 항구도시인지라 할 일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가출을 단행한다. 무작정 떠나온 원산에서 먹고 살기위해 공사판을 전전하였던 그때의 경험은 훗날 그의 건설업 경영을 성공으로 이끈 막강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공사판에서 번 돈으로 원산 상업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미래 도전의 야망을 가슴 속에 품고 서울을 향해 제 2차 가출을 시도한다. 인심이 척박한 서울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 인천의 부두 노동자생활을 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된다. 운 좋게 서울의 삼창 정미소에 취직하여 배달원 일을 하다가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 정미소 경리사무를 보게 되었다. 그는 3년간의 삼창정미소 일이 끝날 무렵 경일상회라는 쌀가게를 개업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전략 물자 통제령을 내려 쌀배급제가 실시되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이번에는 서울 북아현동의 어느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인수하였다. 이 가게도 결국 종업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다. 그는 삼창정미소를 찾아가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신설동에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차렸다.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업에 몰두하였고 서비스 공장은 번창하게 되었다. 1946년 4월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원효로에 세우고 스스로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다 1950년 1월, 현대 건설을 설립하게 된다. 현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현대건설은 국내 유수의 실력 건설 업체로 발전하였다. 수도 복구 사업과 전재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끊어진 한강대교를 성공적으로 다시 이어 현대의 건설업은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1960년대 초기의 경제 우선 정책은 대규모의 정책 건설 사업을 촉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 건설·토목사업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현대건설도 국내 A급 건설업자로서 적극 정책 공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건설업자들이 소규모의 국내 도급 공사를 할 때, 정주영은 건설업의 국제화를 주장하며 해외로 도전할 채비를 하였다. 1977년 정주영은 한국 재계의 본산인 전국 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전경련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한국 실업계를 대변하는 자리이다. 이후 그는 현대건설을 전문 경영자에게 맡기고 또 현대 조선도 일선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위양하였다. 1977년 말 임금 논쟁에서 ‘고임금론’을 제창한 대기업 경영자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 책은 럭키금성의 구인회 회장을 시작으로 쌍용의 김성갑 회장, 경방의 김용완 회장, 전방의 김용주 회장, 대우의 김우중 회장 등 재벌 20인을 대상으로, 출생부터 성장과정, 가정환경, 창업과 성공 과정 등을 서술한 것이다. 편저자인 박동순은 『재벌의 뿌리』 머리말에서 이 책을 서술하게 된 연유를 간단히 밝히고 있다. 1970년 동아일보에서 간행한 『한국 근대인물 백인선』에 근대 기업인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이 책을 구상하게 된 주요 계기였다. 박동순은 경영사 혹은 기업인사의 서술의 어려움을 통감하면서도, 한국 기업인사(史)의 정리를 통해 한국 경영사 전개의 전반적인 재정립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서술했다고 한다. 한국의 기업가들의 생애를 경제사의 전개·발전과정과 관련지어 다루는 것을 한국 경제사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동순은 기업인들의 성장을 각각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각 시대의 경제사적 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창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은 기업의 성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그런 고민은 머리말에서 잘 드러나는데, 조기준의 『한국 기업가사 연구』에서 근대 기업가의 성장을 시대별로 구분한 내용을 인용한다거나, 신용하의 「일본 식민지 통치기의 시대구분 문제」라는 논문을 언급하면서 1945년 해방 이후를 근대 사회로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기업가, 경영자라는 개념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고, 근대 기업인의 시작점을 1945년 해방 이후로 보고 있다. 1945년 이후 60년대를 거쳐 80년대로 이어지는 경제조건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업가의 경제 이념을 다루려고 했고, 그 결과물이 이 『재벌의 뿌리』인 것이다.
다소 고민적인 머리말에 비해 실제 각 인물별 서술은 딱딱하지 않아서 마치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각 인물의 출신 지역별 특징을 이중환의 『택리지』를 인용하여 서술하는 부분이나 출생 혹은 성장 당시 지역 사회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서술은 각 인물의 활동이나 그 활동의 의미를 설명할 때 정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다만 환경과 행위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논리적인 긴밀성은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정주영에 관한 서술에서는, 고향인 통천의 지리적 척박함과 1930년대 열악한 농촌 현실 속에서 가출을 감행한 이후, 식민지 말기의 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 당시의 건설업 호경기(好景氣) 속에서 크게 성장하고, 현대의 창업자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주영의 상재(商材)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였다. 남보다 앞선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기 마련이다. 정주영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확실히 잡았고, 다이나믹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런 위험부담을 모두 극복하였다. 저자는 현대의 급성장을 현대의 빠른 변화 적응력과 정주영과 형제들의 협업체제, 가부장적인 기업 운영에서 오는 강력한 추진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현대의 중공업 체제에 대해서는 「현대의 10대 중공업 체제」(현대그룹 32돌 특집) 자료를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1980년대 제기된 기업인의 윤리관 문제를 사회문제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설립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 등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김수곤 경제학 박사의 「임금과 노사 관계」라는 논문을 인용하며 정주영이 노동자의 고임금론을 제창한 최초의 대기업 회장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재벌의 뿌리』는 개인의 생애와 활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지리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서술하고 있어, 분량은 짧지만 내용은 충실한 느낌을 준다. 게다가 이 책은 1979년에 쓰여졌으므로, 당대 정주영이 어떤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머리말 = 7
具仁會 : 人和 經營의 勝利 = 19
金成坤 : 보스 經營과 水平思考 = 41
金容完 : 民族 資本으로 가는 길 = 59
金龍周 : 正攻法 經營의 半世記 = 79
金宇中 : 60年代의 遺産 = 99
金仁得 : 友情과 事業과 人生과 = 119
金智泰 : 실크 財閥의 理想과 現實 = 139
朴斗秉 : 三代 經營의 底力 = 161
朴仁天 : 無等山에 올라서다 = 183
朴興植 : 老兵은 쉬지 않는다 = 199
辛格浩 : 젊은 베르테르의 執念 = 223
柳一韓 : 버드나무와 企業情神 = 237
李秉喆 : 韓國的 매니지멘트의 꽃 = 261
李源万 : 나일론 시대의 파이어니어 = 285
張學燁 : 眞露王國의 建設記 = 305
全澤珤 : 한 그루 포플러가 자라나기까지 = 327
鄭周永 : 成長의 열매를 萬人에게 = 347
趙重勳 : 世界 속에 韓國의 날개로 = 371
趙洪濟 : 東方의 샛별은 빛나고 = 391
崔泰涉 : 외길 50年의 自負心 = 411